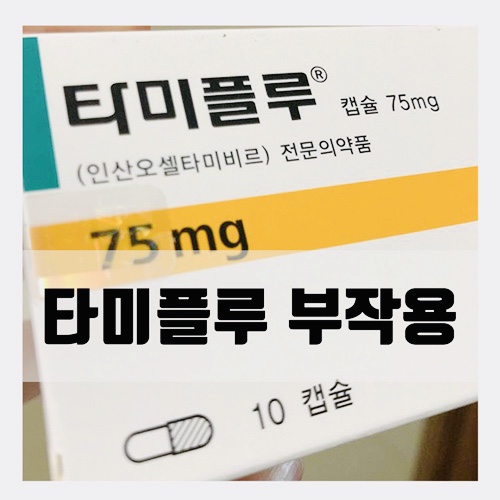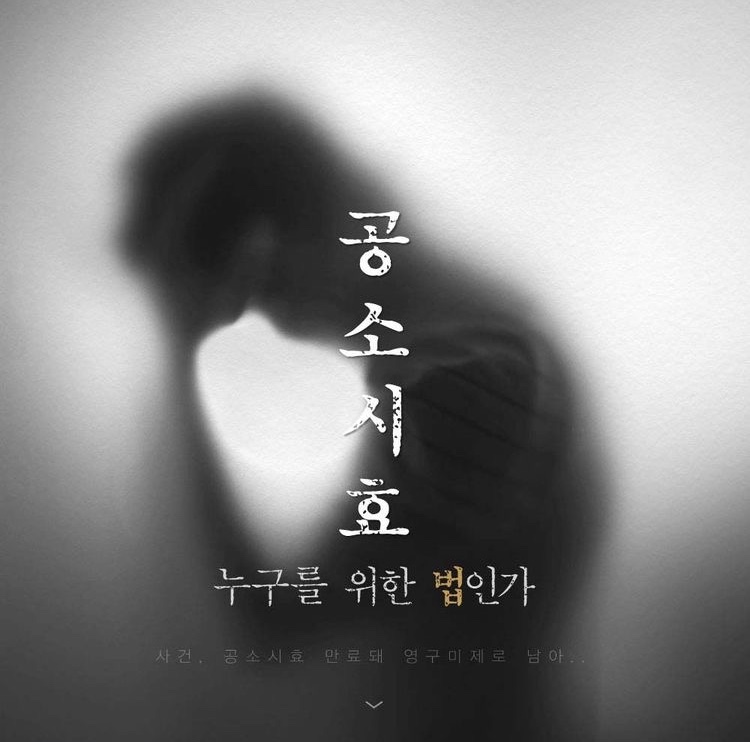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설령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완성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에서 고소·고발이 취소됐을 경우에 내려진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됨).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 공범 1인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현행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다음 기관의 경과로 완성한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아울러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의 배제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의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의 공소시효는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특히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어 2015년 7월 24일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공소시효의 도입 및 논란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즉, ▷시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DNA감식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공소시효를 유연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몰리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회복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또 공소시효를 연장해도 흉악범죄 미제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현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 과거사에 자원이 집중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